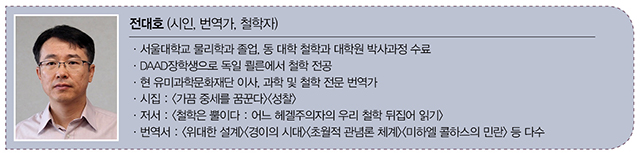TT-Sophy | 탁구와 철학(2) / 글_전대호
스포츠는 몸으로 풀어내는 철학이다.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다 침착한 경기운영을 하게 마련이다. 숨 막히는 스피드와 천변만화의 스핀이 뒤섞이는 랠리를 감당해야 하는 탁구선수들 역시 찰나의 순간마다 엄습하는 수많은 생각들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상극에 있는 것 같지만 스포츠와 철학의 접점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철학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스포츠, 그리고 탁구이야기. 어렵지 않다. ‘생각의 힘’을 키워보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를 크게 진(참됨), 선(착함), 미(아름다움)로 나누는 관행은 칸트의 철학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칸트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중요한 책을 세 권 썼다.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 그것인데, 이 작품들이 차례로 진, 선, 미를 논한다. 각각 학문, 도덕, 예술에 대응하는 이 세 가지 가치는 과연 지고의 덕목이라 할 만하다. 물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1등부터 3등을 진선미로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덕목들도 허울만 남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건 그렇고,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일까? 지난호에 스포츠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승부라고 말한 것에 비춰보면, 스포츠에서 최고의 가치는 승리일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이기는 것이 최고라는 뜻이다. 샅바싸움을 30분 넘게 하느라 관중의 야유를 받더라도 샅바를 상대보다 한 치 더 바투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쉽게 힘을 쓰고 쉽게 이길 수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만약 스포츠가 오로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면 일찌감치 외면당하고 지탄 받았을 것이다. 얼마 전 떠들썩하게 벌어진 파퀴아오와 메이웨더의 권투경기를 생각해보라. 다들 그 ‘세기의 졸전’을 비난했다. 한때나마 태권도를 했었던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지고도 시원한 경기가 있는가 하면 이기고도 찜찜한 경기가 있다. 승자가 된 메이웨더는 어땠을까? 패자가 된 파퀴아오는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 양쪽 다 찜찜했으리라 짐작한다. 안 그랬다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싸우는 둥 마는 둥 경기할 작정이었다면, 그 경기는 졸전을 넘어서 사기극이라고 해야 한다.

아름다운 놈과 강한 놈이 분리되는 시대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조건 승리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강함에서 비롯되는 승리다. 강하고 아름다운 선수가 이길 때 우리는 그 승부를 흔쾌히 인정한다. 내가 패자라도 그렇다.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발차기를 구사하는 상대에게 얻어맞고 지면 실망스러울망정 욕은 안 나온다. 시원한 패배니까. 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꼼수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상대에게 적응을 못해서 엉겁결에 지면 그 분함이 하늘을 찌른다. 막말로 상대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모든 호구를 벗고 UFC 방식으로 다시 붙고 싶다. 실컷 치고받는 태권도 경기를 하고 나서도 그럴진대, 점잖게 갈라서서 공을 주고받으며 겨루는 탁구에서 억울하게 졌다고 느끼면 그 울분이 얼마나 뜨거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아마 캄캄한 뒷골목에서 그 상대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간절히 바랄 정도이리라.
아무튼 울분을 가라앉히고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강함은 과연 다를까? 어쩌면 강한 동작이 곧 아름다운 동작이지 않을까? 예컨대 태권도의 돌려차기나 탁구의 포어핸드 드라이브를 생각해보자. 실제로 맞아보면 아름다운 돌려차기일수록 더 아프다. 아마 드라이브도 상당한 정도로 그러하리라 짐작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놈과 가장 강한 놈은 둘이 아니라 하나일 성싶은데, 과연 그럴까?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강한 놈과 가장 아름다운 놈이 일치하던 때가 실제로 있었다. 이른바 청동기시대다. 당시에 가장 강한 소재는 청동이었는데 그것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소재였다. 찬란한 청동갑옷을 입고 청동검을 휘두르는 무사는 당대에 가장 아름다우면서 또한 강한 존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철기시대가 도래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알다시피 청동은 붉은 빛이 감도는 갈색인 반면 철은 볼품없는 회색이다. 아름답기로 치면 청동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러나 강하기로는 철이 청동을 압도한다. 청동기 무사와 철기 무사가 맞붙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노을빛 찬란한 청동검과 거무튀튀한 철검이 부딪히자 어이없게도 청동검이 두 동강 난다. 아름다운 놈과 강한 놈이 분리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아름다움과 강함의 일치는 신의 경지
다시 스포츠의 동작들을 생각해보자. 태권도에서는 발차기가 점점 더 간결한 쪽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을 추구하고 결국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멋있기로 치면 뛰어 옆차기(속칭 ‘이단옆차기’) 같은 것이 최고일 텐데, 실제 겨루기에서는 그 동작이 사라진 지 오래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공격은 적중하면 KO로 경기를 끝내겠지만, 십중팔구 빗나가는데다가 그럴 경우 공격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겨루기에서 가끔 나오는 화려한 동작인 ‘뒤후리기’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도박에 가깝다. 웬만해서는 안 쓰는 노림수다.
탁구에도 아름다움과 강함의 분리가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정말 교과서 같은 동작으로 모든 스트로크를 깨끗하게 구사하는 홍길동 선수와 어디 길거리에서 막 배운 것 같은 이상한, 소위 ‘막탁구’를 시전하는 임꺽정 선수가 있는데, 경기에서 임꺽정이 매번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정직하고 시원한 탁구를 하는 선수가 온갖 심리적 기술적 전술적 꼼수로 무장한 선수에게 번번이 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사실 아름다움과 강함의 일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경지다. 청동기시대는 신들의 시대였다. 말하자면 신들과 반신반인들이 인간들과 뒤섞여 살던 때였다. 물론 신화 속 얘기다. 철학의 관점에서 신이란 온갖 좋은 속성들을 완벽한 수준으로 모조리 갖춘 존재다. 가장 참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곧 영원히) 존속하고, 가장 크고……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최고인 존재다. 반면 인간은 어딘가 결함이 있기 마련이다. 커트는 세계 수준인데 푸시는 중학교 수준인 선수, 포어핸드는 무적인데 백핸드가 말썽인 선수야말로 인간적이다. 이를테면, 부족한 인간과 인간이 신의 경지를 추구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스포츠라는 표현도 가능할 성싶다. 허망한 패배의 상처를 딛고 아름다움과 강함에서 비롯되는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아름다움과 강함의 일치를 동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인 것에 끌린다. 인간이니 어쩔 수 없다. 듣자하니 요새 강남 부유층 젊은이들은 얼굴, 몸매, 성적이 다 최고라고 한다. 아름다움과 강함이 일치하는 사례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 청동기시대가 다시 온 것일까? 그럴 리야 있겠냐마는 왠지 비현실적인 느낌, 인간적으로 씁쓸한 느낌이 살짝 든다. (월간탁구 2016년 1월호)

▲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