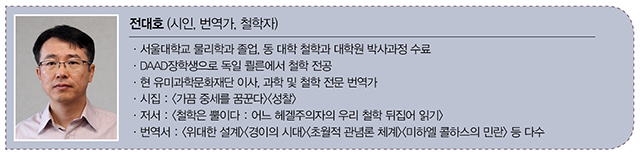TT-Sophy | 탁구와 철학(15) / 전대호
코치도 관중도 스포츠의 주체
스포츠의 주체는 누구일까? 당연히 가장 먼저 선수를 꼽아야 한다. 탁구대를 중간에 놓고 맞서 승부를 겨루는 두 선수가 스포츠를 한다. 그러나 스포츠의 주체를 선수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네트 옆에 엄숙히 앉아있는 심판을 생각해보라. 그는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스포츠의 주체다.
더 나아가 탁구경기장 곁 벤치에 앉아 손에 땀을 쥐는 코치와 동료 선수들은 어떠한가. 팀 동료들이야 선수의 멋진 플레이에 물개 박수를 치고 가끔 ‘화이팅’을 외쳐주는 역할에 머물 때가 많지만, 코치는 상당한 정도로 경기에 개입한다. 타임아웃이나 게임과 게임 사이 자투리 시간에 코치가 선수에게 전하는 조언은 때때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관중도 스포츠의 주체라고 할 만하다. 프로축구 경기에서 원정팀보다 홈팀의 승률이 높은 이유 하나는 관중의 응원이다. 관중의 열광, 격려, 야유는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중도 어엿한 스포츠의 주체다.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 경기장 근처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사진기자들, <월간탁구>를 비롯한 스포츠 매체 종사자들, 체육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의 주체다.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고, 스포츠계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 중에서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지 싶다. 이 대목에서 나쁜 왕 서방들을 성토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이 글의 목적은 코치의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의 배후를 탐색해보는 것이다.

탁구경기장에 임박한 요란함
코치를 비롯한 어느 누구의 개입도 철저히 막는 스포츠 종목으로 바둑이 있다. 코치, 동료, 관중, 기자는 경기장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경기장은 격리된 방이며, 그 안에는 두 선수만 있다. 추가로 계시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알람시계의 역할만 한다. 경기는 오롯이 선수들의 몫이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은 코치의 개입을 다양한 정도로 허용한다. 농구와 배구에서는 코치가 타임아웃을 요청하여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선수에게 조언할 수 있다. 야구 코치는 수시로 경기장에 들락거릴 수 있다. 권투 코치는 아예 ‘세컨second’이라는 이름(코치가 ‘두 번째’ 선수라는 뜻을 함축함)으로 링 사이드에 붙어서 때로는 경기 내내 요란하게 떠든다. “잽, 잽 뻗어! 스트레이트, 원투, 돌아, 돌아, 백스텝!” 물론 이런 외침이 선수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긴 하지만 말이다.
탁구에서는 어떨까? 흥미롭게도 최근에 국제탁구연맹은 경기 중 코치의 조언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기존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원래 탁구 코치는 게임과 게임 사이의 자투리 시간이나 한 매치에 딱 한 번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타임아웃 시간에만 선수에게 조언할 수 있었다. 그밖에 모든 시간에 코치가 몸짓이나 말로 선수에게 조언하는 것은 모조리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새 규정은 모든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상황에서 코치가 조언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테면 선수가 공을 주우러 가거나 땀을 닦거나 서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코치의 조언이 가능해진 것이다. 머지않아 선수들과 코치들이 새 규정에 적응하면, 탁구 경기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요란해질 것이다.
그 요란함이 탁구 경기를 더 생생하고 화끈하게 만들 것이라며 새 규정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탁구의 매력은 숨 막히는 긴장과 미묘한 신경전과 치열한 두뇌싸움에 있다면서 임박한 요란함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 아무튼 철학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코치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도가 종목마다 다르고 한 종목에서도-탁구 규정의 최근 변화에서 보듯이-시대마다 다른데, 왜 그런 차이와 변화가 생길까?

결국 탁구는 몸의 스포츠다
코치의 개입을 얼마나 허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스포츠 종목들을 나열하면 아마도 양극단에 바둑과 권투가 놓일 것이다. 바둑은 가장 엄격한 금지, 권투는 가장 관대한 허용에 해당한다(권투 코치는 타월을 던져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 탁구의 위치는 이제껏 권투보다 바둑에 훨씬 더 가까웠지만 규정 변경으로 조금 더 권투에 가까워졌다고 하겠다. 왜 바둑은 코치의 조언을 철저히 막는 반면, 권투는 넉넉히 허용할까? 결정적인 기준은 코치의 조언을 선수가 실행하기가 얼마나 쉬우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바둑에서 조언, 곧 훈수를 그대로 실행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일러준 자리에 돌을 놓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반면에 권투에서 “레프트 바디! 옆구리, 옆구리!”라는 조언을 그대로 실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코치가 목이 쉬도록 떠들게 놔둬도 된다. 경기는 어차피 선수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그럼 탁구에서는 어떨까? 과거 탁구 규정은 탁구 코치의 조언을 선수가 그대로 실행하기가 꽤 쉽다는 판단을 기초로 삼았던 것 같다. 마치 바둑에서처럼 신의 한수를 일러주면 승부가 뒤집힐 수 있다고 여겼기에 코치의 조언을 엄격히 제한했던 것일 게다. 반대로 새 규정은 권투와 유사하게 탁구에서도 조언의 실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기초로 삼은 듯하다. 필자는 새 판단에 찬성표를 던진다. 아무리 이성적인 측면이 중요하더라도, 결국 탁구는 머리의 스포츠가 아니라 몸의 스포츠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대세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탁구, 힘과 스피드의 탁구가 아닌가. 과거 탁구 규정을 만든 사람들은 탁구를 무척 지적이고 냉철하며 예절바른 활동으로 여겼던 모양인데, 그것이 속 좁은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국제탁구연맹이 코치의 조언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인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월간탁구 2017년 2월호)

스포츠는 몸으로 풀어내는 철학이다.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다 침착한 경기운영을 하게 마련이다. 숨 막히는 스피드 와 천변만화의 스핀이 뒤섞이는 랠리를 감당해야 하는 탁구선수들 역시 찰나의 순간마다 엄습하는 수많은 생각들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상극에 있는 것 같지만 스포츠와 철학의 접점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철학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스포츠, 그리고 탁구이야기. 어렵지 않다.‘ 생각의 힘’을 키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