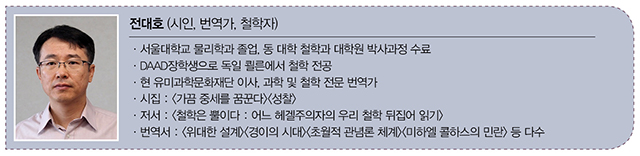TT-Sophy | 탁구와 철학(16) / 전대호
천국은 가능할까?
대결은 필연일까? 너무 추상적이고 짤막한 듯하니, 다시 묻자.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서로 맞서 드잡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까?
필자는 어릴 적에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부르던 노래들 중 하나에 이런 가사가 있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 쳐도 다치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일단 노래니까 즐겨 부르면서도 약간 미심쩍었다.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야 물론 환영하지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논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 같았다. 그런 사자는 뭘 먹고 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며 굶주릴 때 하늘에서 내렸다는 ‘만나’(구약성서<출애굽기>16장)가 떠올랐다. 마치 서리나 눈처럼 온 땅 위에 내린 만나를 핥아먹는 사자라……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어린 양이었다. 아무리 사랑과 기쁨의 나라이고 사자는 만나를 실컷 먹어서 배가 부를 대로 부르더라도, 어린 양이 이를테면 사자의 장난스러운 앞발 후리기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할까? 아마 갓 태어나 천지도 구분 못하는 어린 양일 게다. 그럼 어른 양들은 어떨까? 나로서는, 풀밭 너머 저만치에서 불안한 눈초리로 새끼와 사자들을 바라보는 양떼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 노래하니까 따라 하면서도 흥이 나지 않았다.
기독교의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역사와 철학과 문학에 등장하는 숱한 이상향은 대결이 없는 곳으로 그려진다. 오직 평화가 지배하는 곳. 그런 유토피아의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현실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기에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나라를 떠올렸을까를 생각하면, 절로 숙연해진다. 평화의 유토피아는 전쟁의 피로 물든 벌판에서 피어난 들꽃과도 같다. 북극 근처 툰드라 평원을 한순간 하얗게 뒤덮었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들꽃. 그렇게 덧없지만 계속 다시 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상향에도 대결은 있다!
그런데 이상향은 반드시 대결이 없는 곳이어야 할까? 만약에 이 질문의 답이 ‘그렇다’라면, 필자는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대결을 포용하는 이상향이 존재한다! 중국문화권의 이상향을 이야기하라면, 누구라도 가장 먼저 무릉도원을 꼽을 것이다. 도교의 색채가 강하게 밴 무릉도원은 신선들의 주거지다. 그런데 무릉도원에서 신선들은 무엇을 하며 살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상한 철학과 종교의 차원에서 일상적인 소문의 세계로 과감히 뛰어내릴 필요가 있다. ‘신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길고 하얀 수염과 눈썹? 옳거니, 그것은 장수의 상징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틀림없이 다섯 번째 안에 바둑이 떠오를 것이다. 바둑 하면 신선놀음, 신선놀음 하면 바둑이 아닌가! 오호라, 무릉도원에는 바둑이 있다. 넓게 보면, 스포츠가 있다. 스포츠는 대결이다. 그러므로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에는 엄연히 대결이 있다.
신선의 바둑은 속인의 바둑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성석제의 명작 단편소설 <고수>를 읽어보시기를 권한다(짧고 엄청나게 재미있을 뿐더러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라면 필자는 함구하겠다. 다만, 바둑에서 상대의 약점을 잔인하게 파고드는 침투, 상대의 짜증을 유도하는 흔들기, 속 보이는 꼼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놓는 무리수, 악착같은 마무리를 언급하겠다. 나아가 이 모든 세속적 요소들이 탁구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장담한다. 필자는 탁구의 세부 전술에 대해서 별로 모르지만, 탁구도 엄연히 스포츠요 대결인데 어찌 세속적이지 않겠는가? 때로는 잔인하고, 저급하고, 노골적이고, 터무니없고, 악착같을 것이 뻔하다.
신선들의 바둑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럼, 신선들도 바둑을 두다가 가끔은 여러 이유로 화가 치밀어 판을 뒤엎기도 한다는 말인가? 솔직히, 이 질문에 답하기엔 필자의 공부가 아직 얕다. 아무튼 신선들도 진지하게 세속적으로 대결할 것이며, 혹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라면, 대결의 짜릿함을 더 능숙하게 즐길 것이라고 추측해볼 뿐이다.

스포츠의 ‘공정함’ 현실에서 가능할까?
대결은 필연일까? 많은 사상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도리어 평화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에서의 대결은 우리가 잠시 어리석기 때문에, 또는 그밖에 여러 일시적인 이유로 발생할 따름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지혜에 이르거나 참된 본성을 되찾거나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햇빛이 비추는 순간에 그림자가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모든 대결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말이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 옳다면, 스포츠는 전망이 밝지 않다.
필자는 ‘대결은 필연일까?’라는 질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 엄연히 있는 대결들을 인정하고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스포츠의 수준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숙고하는 것이 요긴한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스포츠를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부른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지만, 스포츠와 현실의 관계를 단순히 축소판과 확대판의 관계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이 순박한 시각이다. 하나만 지적하면, 스포츠에서 패배는 기꺼이 인정하고 다음 판의 디딤돌로 삼을 만한 경험이지만 우리 현실에서 패배는 적지 않은 경우에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선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날벼락, 심지어 곧 죽음이다. 적어도 우리 현실은 스포츠와 사뭇 다르다.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다르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패배를 스포츠의 그것처럼 받아들일 만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스포츠에서처럼 공정하고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대결의 필연성을 둘러싼 형이상학적 논쟁이나 평화로운 이상향에 대한 동경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월간탁구 2017년 3월호)

스포츠는 몸으로 풀어내는 철학이다.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다 침착한 경기운영을 하게 마련이다. 숨 막히는 스피드 와 천변만화의 스핀이 뒤섞이는 랠리를 감당해야 하는 탁구선수들 역시 찰나의 순간마다 엄습하는 수많은 생각들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상극에 있는 것 같지만 스포츠와 철학의 접점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철학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스포츠, 그리고 탁구이야기. 어렵지 않다.‘ 생각의 힘’을 키워보자.